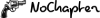경기가 계속해서 좋지 못하니 미술계 타격도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크다. 미술품 경매시장은 물론 개인 화랑도 죽을맛이라고 아우성 중. 예술가들의 비밀 시리즈에(사실 비밀이랄 것도 없지만ㅋ)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과거 힘든 시절을 예술가들은 어떻게 보냈는지 몇 회 정도 쏴보겠다. 관심 있는 사람만 읽겠지만 아무튼 그래. ☁️☁️🔫

전쟁은 예술을 죽이지 못했다.
죽을 만큼 배고픈 순간에도, 마음속에 남은 걸 그리던 이들이 있었다.
가진 것이라곤 손과 마음뿐이었던 두 사람, 이중섭과 박수근 이야기다.
이중섭 1916 - 1956
이중섭은 피난지 부산에서 통조림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다.
물감은 커녕 종이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남긴 은지화들은 지금 미술사적 걸작이지만, 당시엔 고철장에 버려질 재료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그를 별로 이해하지 못했다.
배급받은 쌀도 제대로 못 먹는 판국에, 뭐가 좋아서 소나 낙서를 그리고 있냐고.

소와 은지 낙서화
이중섭은 소를 많이 그렸다.
그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가족이었고, 잃지 않으려 했던 삶의 의지였다.
그의 작품들에서 또 하나 감동적인 부분은 그의 소 뿐만 아니라, 바로 그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에서 비롯된 가족화들이다.
특히, 그가 가족을 그리워하며 그린 은지화와 편지들은 그만의 고통스러운 삶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다.


그리운 나의 남덕, 사랑하는 아들들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중섭은 이미 일본에서 귀국한 상태였다.
가족은 일본에 있었고, 그는 한국에 혼자 남겨졌다.
지금처럼 연락도 쉽게 할 수 없었다.
그렇게 그는 몇 년 동안 그림과 편지로만 가족에게 말을 걸었다.
심지어 돈이 없어 일본으로 부치는 우편요금도 구걸하다시피 구했다.
힘들게 사는 이중섭을 딱히 여긴 친구가 여렵싸리 신문 삽화 일을 구해다 줬지만 상업적인 탓이었을까.
이중섭은 이를 거절했다.

자네.. 나랑 카레 가게 같이 하지 않겠나?
한동안은 동료화가 박고석이 부산 광안리에 연 카레라이스 가게에 동업을 제안하고 같이 일한 적도 있다.
하지만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이중섭은 가게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가끔 나타나서 카레 몇그릇을 먹어치우는 등 오히려 방해가 됐던 듯 하다. 실제로 그를 대식가로 기억하는 이들이 있다 하니 순수영혼 이중섭이 노상 가게에서 카레를 연거푸 축내는 모습을 상상하니 측은하면서도 귀엽게도 느껴진다.

쓸쓸한 마지막
그는 점점 '미친 화가'가 됐다.
대구에 와서는 여관 손님의 신발을 모두 씻어버리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고 입원 중인 병원에서 병실 세 곳을 온통 흰색 페인트로 칠해버리기 까지 했다. 이중섭은 이와중에도 은지화에 손톱으로 그림을 그리는 등 처절히 작업활동을 이어나갔다고 한다.
결국 이중섭은 서울 서대문 적십자 병원에 입원한지 한달만인 1956년 9월 6일, 간경화가 악화되어 40세로 쓸쓸히 생을 마쳤다.
당시 그의 장례식엔 화가 친구 몇 명만이 참석했다.
박수근 1914 - 1965
박수근은 달랐다.
좀 더 현실적이었고, 살아남는 법을 택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화가라는 직업만으로 먹고살 순 없었다.

현실과 예술을 잇다
그는 미군 PX에서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일을 시작해 서울 창신동에 간신히 작은 집 한칸을 마련했다.
낮에는 생계, 밤에는 예술.
이런 식의 일상이 이어졌을 것이다.
박수근의 그림엔 붉은색도, 노란색도 거의 없다.
거칠고 바스러질 듯한 질감의 회색과 미색.
그건 분명 '그의 삶의 색'이었다.

삶의 질감, 한국의 미감
그의 그림엔 화려한 색도, 파격적인 붓질도 없다. 그는 유화물감을 마치 흙처럼 바르고, 마른 캔버스 위에 두텁게 쌓았다.
마티에르가 아니라 '생활의 질감'에 가까운 그 표면은, 마치 바닥에 오래 닿은 벽처럼 갈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거칠다'고 하고, 누군가는 '소박하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돈이 없어 물감을 제대로 사지 못해도, 그는 재료 탓을 하지 않았다.
캔버스를 구할 수 없어 마대천 위에 그림을 그렸고, 콩기름 같은 일반적인 재료를 쓰기도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거칠고 무딘 표면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 마음속에 남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은 점점 명동 반도화랑에서 외국인들에게 반응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특유의 작품 스타일에서 한국의 정서를 깊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찾은 미술 애호가들에게는 좋은 컬렉션이 됐던 것.
하지만 박수근의 전성기는 길지 않았다.
과음으로 인해 간염과 신장염 등이 악화되어 1965년, 51세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두 작가는 예술가이기 전에 '버티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이중섭이 행복을 꿈꾸며 버텼다면 박수근은 땅을 디디며 버텼다.
두 사람 다 가난했고, 전쟁을 겪으면서도 그림을 붙잡았다.
지금처럼 정부의 지원도, 후원자도 없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건
자기 안에서 뭔가 '그리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림 하나에 담긴 시간은,
그림을 그릴 수 없어도 손을 움켜쥐고 버티던 '살아낸 시간'이었다.
혹시 이중섭과 박수근을 단지 미술 교과서 속 화가라고 생각했다면
오늘은 한 번, 그렇게 버텨내며 꿈꿔온 '인간' 이중섭과 박수근을 떠올려보면 어떨까.
지금도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고,
그림 같은 꿈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어디선가 조용히 그리고 있다.
관련 글
일본 아이들은 그림을, 어른들은 전쟁을 준비했다 - 가난한 시대의 예술
전편에 쓴 한국전쟁 시기 이중섭과 박수근 작가의 고난의 생존기 이후로 일본의 전쟁 전후 시기, 아동미술을 이용했던 일화를 써본다. 전쟁을 준비하던 일본은 어린아이들의 그림을 대체 무슨
nochapter.tistory.com
'비밀스런 예술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본 아이들은 그림을, 어른들은 전쟁을 준비했다 - 가난한 시대의 예술 (0) | 2025.04.22 |
|---|---|
|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ADHD? (1) | 2025.01.24 |
| 잭슨 폴록은 담배꽁초로도 그림을 그렸다. (0) | 2025.01.24 |
| 르누아르의 관절염 (0) | 2025.01.04 |
| 피카소가 모나리자를 훔쳤다? (0) | 2025.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