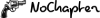노챕터는 10년 넘게 미술계에 있었고, 미술품경매 시장 안에서 오래 일했다. 수많은 낙찰과 유찰, 디피와 철수를 거치며 깨달은 건 하나. 시장은 기술보다 흐름에 반응한다는 것. 오늘 쏘는 글은 기술이 아닌 '흐름'의 이야기. ☁️☁️☁️🔫
🔍 서울옥션과 케이옥션, 갑자기 주가가 뛴 이유는?
2025년 4월 30일 오전, 미술 경매사 두 곳의 주가가 움직였다. 케이옥션은 9시 6분 3,520원으로 시작해 10시 55분 4,240원을 기록했다. 서울옥션은 전날 7,030원에서 마감된 뒤, 같은 날 9,100원까지 도달했다. 단기간의 급등이다.
이번 주가 급등의 표면적 계기는 두 회사가 이미 추진해온 증권형 토큰(STO, Security Token Offering) 기반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이 다시 주목받은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사업 진출 이상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STO 법제화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핵심 정책 의제로 내세우고, 이재명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에 STO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정치권에서 STO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책 기대감이 크게 부각됐다. 여기에 이재명 캠프의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에 서울옥션 사외이사인 유홍준 교수가 선임된 점, 미술시장 구조 변화와 일부 기업의 실적 개선 전망, 그리고 정책·테마주로서의 투자심리가 한데 맞물리며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인 것이다.

🧩 STO, 이건 뭘까?
STO는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위에서 쪼개고, 디지털 토큰 형태로 유통시키는 구조다. 미술품처럼 고가이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이 기술이 도입되면, 누군가는 그 작품의 일부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림 한 점을 함께 소유한다는 개념. 지금 이 시점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하지만 이 기술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몇 해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고, 다만 그것을 받아줄 시장 구조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서야 기회가 온 걸까?

⚠️ 그 구조가 무너졌던 사건 — 피카 프로젝트
예상보다 빠르게, 비슷한 구조가 이미 등장한 적이 있다. 바로 피카 프로젝트다.
2021년, 피카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반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을 표방하며, 미술품을 소액 단위로 공동 구매하고, 소유권을 토큰으로 인증하는 구조를 내세웠다. 당시로서는 지금의 STO와 유사한 혁신적 시도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결말은 달랐다. 미술품 감정가 부풀리기, 실물 확보 미비, 회수 시점과 매각 절차의 불투명성, 운영진의 불성실한 정보 공개 등으로 신뢰가 급격히 무너졌다. 피카코인(PICA)은 2021년 업비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고, 이후 대표 등 경영진이 시세조종·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사업 자체가 법적 문제로 번졌다.
이 사건은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 전체에 큰 불신을 남겼다. 기술적 혁신만으로는 신뢰와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교훈과 함께, 조각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한동안 '사기'와 동일시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됐다.
🏛️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이 다른 점
다를 수 밖에.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은 미술 경매를 수년간 이어온 상장 기업이다.
작품 감정, 거래 이력, 시장 흐름에 대한 기본 신뢰가 있다. 이들은 조각투자를 단기 수익 모델로 도입하는 게 아닌 기존 경매 구조를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견작가의 고정가 판매 작품군, 혹은 일정 가치 이상을 갖는 작품을 대상으로 한 구조화된 조각 판매. 분할 낙찰 개념. 이익만을 향해 달리는 플랫폼이 아닌, 구조를 다시 설계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이 진짜로 추구하는 것
이들의 목표는 단순하지 않다.
경매라는 일회성 이벤트를, 상시 유통 가능한 디지털 자산 구조로 전환하는 것. 미술품을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는 대상, 그 흐름 속으로 가져오려는 시도다. 단일 소유에서 분할 소유로. 실물 기반 자산에서, 디지털로 추적 가능한 구조로. 바뀌는 건 방식만이 아니라, 그림을 갖는 감각 자체다.
📉 경제 침체가 만든 구조 변화
이 흐름은 갑자기 도착하지 않았다. 2022년 이후, 한국 경제는 소비 위축, 고금리, 부동산 정체로 뒤흔들렸다. 미술 시장 역시 위축됐다. 고가 작품은 유찰됐고, 중저가 시장은 거래 자체가 줄어들었다.
2024년 글로벌 미술시장 거래액은 전년 대비 12% 줄었지만, 5,000달러 이하의 저가 작품은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했다. 대형 경매보다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플랫폼, 온라인 개인 간 거래가 성장한 결과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하입앤, 프립아트 같은 플랫폼은 활발하지는 않지만, '작게 소유하고 교환하는 감각'은 분명 시장 안에서 확산되고 있다.
소액작품을 눈으로 보지 않고 플랫폼에서 사고 판다는 개념은 이제 MZ세대들에게는 놀랍지 않다.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럼 그 다음은 조각투자 아니겠는가?
🔄 조각투자는 이제야 흐름을 만났을지도 모른다
두 회사는 기존 경매 구조를 유지하면서 조각투자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다. 서울옥션 계열의 '소투', 케이옥션 계열의 '아트투게더'는 이미 야요이 쿠사마, 앤디 워홀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조각투자를 시도했고, 일부 상품은 공모 시작 직후 완판되기도 했다. 다만, 최근에는 미술품 시장 침체와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일부 조각투자 상품이 완판에 실패하거나 청약 미달을 기록하는 등 시장의 온도차도 드러나고 있다.
해외도 사정은 비슷하다. 미국의 Masterworks, Otis 등은 피카소와 워홀 같은 블루칩 아트를 쪼개어 판매하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유동성 한계와 현금화의 어려움이 남아 있다. UBS와 Art Basel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침체기일수록 미술품의 대중적 접근성과 유동성이 중요해지고, 실제로 최근 글로벌 미술시장에서는 저가 작품 거래가 늘고 고가 작품 거래가 줄어드는 구조 변화가 진행 중이다.
STO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제 미술시장 구조 변화의 전략적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기술과 흐름이 만난 지금, 조각투자는 미술품 투자 대중화와 시장 유동성 확대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유동성·현금화 리스크와 시장의 성숙도라는 과제도 함께 남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시장은 이제 정교한 설계와 신뢰를 요구한다.
조각투자가 진짜 성공하려면,
예술과 자본 사이, 그 미세한 균형 위에 우아하게 설 수 있어야 한다.
관련 글
배당도 없는데 배당세? – 조각투자자들을 덮친 49.5%의 그림자
노챕터는 지난 글에서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의 주가 상승과 조각투자 구조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오늘은 그 구조 위에 새로 덧씌워진 세금의 레이어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 –
nochapter.tistory.com
'천 원의 통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배당도 없는데 배당세? – 조각투자자들을 덮친 49.5%의 그림자 (0) | 2025.05.12 |
|---|---|
| 90일 뒤엔 진짜 올까, 글로벌 경제의 도가니탕 (0) | 2025.04.10 |
| 겁없이 미장 월배당주에 투자했다2 - AGNC 고배당의 매력 (1) | 2025.03.18 |
| 겁없이 미장 월배당주에 투자했다1 - AGNC 너 괜찮은거니 (0) | 2025.01.24 |